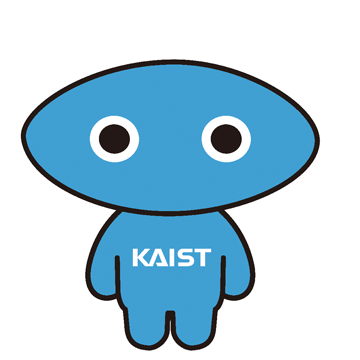최재천의 곤충사회
최재천
- 책 선정 이유 : 책의 소중함을 느끼고 충동적으로 구매
- 책 취득 방법 : 수내역 북스리브로에서 구매
나는 지혜를 자연으로부터 배운다. 길가다 고작 나무 한 그루를 관찰하면 표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나뭇가지가 어떤 프랙탈을 이루는지 확인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나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한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세상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서 조금이라도 외부의 사실을 집어넣지 않으면 금방 사라질 향수같은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동식물을 행동을 더욱 관찰하고 싶었고, 수내역 북스리브로에 들려서 분홍색 책을 하나 샀다.
이 책은 내가 좋아하는 두 가지를 엮어놓은 책이다. 자연이 지니는 사회는 올바른 구조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며, 최근 읽은 sign of structure 와도 깊은 관계를 지닌다. 그래서 인공적인 지능을 연구하는 나는 사회를 관찰하고 조금이라도 모방하려고 애쓴다.
이 책을 통해서 배운 모방은 집단이다. 유전자의 존재 이유를 아는 것처럼 집단의 존재 이유를 알고, 인간사회에서 집단의 존재를 계산해봤을 때 나오는 극단적인 효용의 법칙은 나에게 굉장히 슬픈 사실로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이 책으로부터 내가 배운 내용을 깊게 다루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내가 남기고 싶은 지식은 개체의 목적성에 대한 것이다. 전두엽이 극도로 발단된 인간이 지니는 집단의 목적은 적자생존을 위한 적합한 집단을 형성하고 생존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유전자로 씌여지 개미와 다르게 계획을 세우는 전두엽은 공통의 인간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렇기에 나는 이 책을 읽고 더 이상 집단을 고정된 상태로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이득을 위해서 정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슬프게도 인간은 집단을 매 순간 선택한다. 마치 다크나이트의 하비 덴트처럼 동전을 던져서 오늘의 집단을 고르는 것처럼, 집단은 선택적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 책을 읽고 배움에 대한 기쁨보다 관찰된 사실에 심리적으로 아픔을 느낀다.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이 나와 같은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집단의 목적을 계산하였기에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계산을 하도록 권하고 싶지 않다.
배움은 기쁨이지만, 모든 배움이 기쁨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보다.